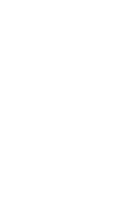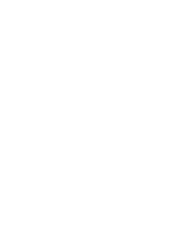스웨덴 한림원이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54)을 선정하면서 언급한 작품은 모두 9종(단행본 기준, 단편으로 ‘에우로파’도 언급됐다)이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 삶의 유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이 한강 작품에 대한 총평이다. 틀린 평가일 수 없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작중 ‘사람’이 눈사람이 되고(단편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2015) 식물이 되고(단편 ‘내 여자의 열매’·1997, 장편 <채식주의자>·2007), 죽은 이가 말하고(<소년이 온다>·2014), 죄다 잊혀진 이들과 새삼 작별하지 못한다(<작별하지 않는다>·2021)니? 이처럼 불가역의 물리를 가역적 사태로 뒤집는 것은 단순한 ‘시적 산문’이 아니라, 전반의 ‘시적 서사’요, ‘시린 겨울’에서 벼려낸 ‘시어’라 해야겠다. 시적 서사와 그 시어로 한강은 육신과 영혼, 생과 사의 경계를 미학적으로 탐찰하고 있다.
한강은 또한 개인과 정치, 즉 개인과 역사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해외엔 덜 소개된 한강의 첫 장편 <검은 사슴>(1998)때부터 확인되는 바다. “나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쳤던 여성이 주인공이다. 지극히 개인적 면모를 들춰 인간 생래의 고통을 좇는 이 소설의 배경이 어디이던가. “농촌에서 쫓겨나고 도시빈민지역에서도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으로 남겨두웠던 도시” “사고로 죽고, 사고로 안 죽으면 진폐로 죽고” 그렇게 “죽을 만큼 부려먹다가 필요 없게 되었으니 아무런 대책 없이 쫓아내버”려진 이들의 터, 강원도 가상의 한 폐광촌이다. 1970년대 산업 역군에서 80년대 청산 대상이 되어버린 ‘탄광 막장’이 바로 주인공의 새까만 내면의 고향인 것이다. 한국 역사는 당시 저항에 나섰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군사정부에 의해 고문, 조작 수사되어 옥살이까지 해야 했다고 적고 있다. 그처럼 한국 현대사를 할퀸 공동체의 상처를 ‘증언’하는 한국의 작가들은 한강 말고도 많다. 한강의 노벨상은 그런 한국 작품이 더 많이 호명될 필요성을 말한다. 냉전의 마지막 전장, 유일의 분단국, 유엔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21세기 도약한 선진국이라는 작은 반도에서 불행히도 ‘비극’과 ‘참사’는 끊이지 않았고, 그 앞에서 ‘무엇이 인간이게 하는가’ 묻는 문학 또한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발 없는 새>
소설가 정찬(71)의 단편 ‘슬픔의 노래’는 한국어로 쓰인 가장 밀도 높은 아우슈비츠 비극 서사일 것이다. 그가 난징학살, 문화대혁명과 홍위병, 일본군위안부와 결부되어 고통받고, 고통을 주면서 거듭 고통받은 아시아인들을 한데의 인연으로 직조했다. 유명 홍콩 배우 장국영의 자살로 소설은 시작한다. “발 없는 새”는 배우 장국영이 제 삶을 읊조리듯 영화 <아비정전>에서 외던 대사다. 발이 없는 새는 지상에 머물 수 없다. 허무와 슬픔, 늘 부유하는 비극적 운명의 시현인 것이다. 그러나 정찬은 그 운명적 삶을 견뎌 보듬어가는 ‘발 없는 새’들을 실로 아름답게 그려낸다.
<아버지의 땅>
작가 임철우(70)의 소설집(1984). 그중 단편 ‘사평역’은 겨울밤 전라도 시골 간이역에서 연착 중인 열차를 기다리는 장삼이사들 얘기다. 학생운동으로 갓 제적된 대학생, 돈 벌고자 중졸에 상경해 술집서 일하는 여성, 늙고 병든 농부 등. 광주항쟁의 상흔, 희망을 잃은 촌락, 단 한 번 발화되지 못할 무지렁이들의 비애적 삶이 역사(驛舍) 밖 퍼붓는 눈 따라 모처럼 이야기로 쏟아져 나오지만, 이내 그 눈에 파묻히고 말 듯하다. 작가 한강이 15살에 읽고 특정 인물 대신 “인간의 삶 자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적인 리듬을 가지고 끝까지 흘러가는 게 무척 놀”라웠다며 “나름의 방식을 가진 소설을 언젠가 쓰고 싶다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 작품이다.
<눈먼 자들의 국가>
<한겨레>에서 2024년 상반기 한국 시인들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21세기 가장 반시적(反詩的)인 사건’으로 최다 언급된 것이 ‘세월호 참사’다. 시에서도 불가능한 비극이란 말일 것이다. 2014년 4월 여객선 한 척 가라앉고, 300명 넘게 수장됐다. 책은 희생자를 추모하면서도 비극을 망각하지 않도록, 문인이 중심 되어 글을 엮은 산문집이다. 소설가 김애란·김연수·박민규·황정은, 시인 김행숙·진은영 등이 썼다.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여 웅크린 언어로, 사력을 다하여 쓴다, ‘절망 금지’를.
<제주도우다>
한강이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2021)를 쓰며 참고한 자료 가운데 작가 현기영(83)의 장편 <지상에 숟가락 하나>(1999)가 있다. 강제된 금기였던 제주 4·3의 비극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면화한 소설 <순이 삼촌>(1978)의 저자로 이후 ‘4·3 제주’의 문학적 구원에 헌신해온 이가 현기영(83)이고, 그 긴 여정의 대단원이 4년 걸쳐 완성한 3권짜리 소설 <제주도우다>이다. 노인 안창세가 10대 중반 겪은 학살의 참극을 그의 손녀 부부가 다큐멘터리로 만들고자 한다. “누나와 외삼촌을 한꺼번에 잃었고 그 자신도 죽음의 문턱 바로 앞까지 끌려갔었다”던 안창세는 그러나 더 말하기를 마다한다. 당시를 기억하길 거부하는 것이다. 왜일까. 소설에서 간구한 이어 말하고 이어 듣기가 또한 <작별하지 않는다>이다.
<파문>
1970~80년대 한국은 국가 주도형 산업화의 시기였다. 군부독재 정권 때였다. 사상 탄압, 인권 유린, 노동 착취가 만연했다. 노동권을 주장하는 노동자가 ‘반공 국시’를 흔드는 ‘빨갱이’로 내몰리곤 했다. 그 노동자의 투쟁과 삶을 다룬 소설가의 작품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가 직접 쓴 소설은 극히 드물다. 1980년대 노조 탄압하는 군사정부에 맞서 역대 가장 긴 저항과 가장 많은 해고자를 기록한 원풍모방(섬유직물 제조업체)의 10대 여공 출신 장남수가 글쓰기를 배워가며 쓴 소설이 그중 올돌하다. “소설이 아니면 쓸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와글와글 치밀면서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끝내 풀어낸 이야기가 7편 단편으로 재구성됐다. 이건 ‘기록’의 완결이 아니다. 늙은 어머니가 중년 된 딸에게 지난날 학교 대신 공장 보냈다 사과하니, 화해하고 치유하는 여정의 비로소 시작이다. 소외된 자들이 사력을 다해 자신을 존재증명할 때, 내일 소외될 자들의 존재도 건사된다.
임인택 집필
<한겨레>에서 문학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 입사해 탐사기획팀장, 스페셜콘텐츠부장 등을 지냈다. 한국기자상을 네 차례 받았다. 관훈언론상을 받았다. <4천원 인생>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등을 공저했다. 〈매그넘 코리아(MAGNUM KOREA)-매그넘이 본 한국〉 사진집 캡션을 썼다.
The Swedish Academy’s decision to award Han Kang the 2024 Nobel Prize in Literature was based on consideration of nine of her single volume books, with special mention of the short story “Europa.” While the Academy’s overall evaluation of Han’s works as “intense and poetic prose that directly confronts historical trauma and reveal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is an accurate assessment, it doesn’t fully capture the essence of her writing. In Han’s literary universe, “people” turn into snowmen (“While a Snowflake Melts,” 2015) and plants (“Fruits of My Woman,” 1997, and The Vegetarian, 2007); the deceased speak (Human Acts, 2014) and people cannot bid farewell to all the forgotten (We Do Not Part, 2021). This reversal of seemingly irreversible physical laws is not merely an instance of “poetic prose.” Rather, it is a manifestation of a “poetic narrative” that permeates Han’s works, a “poetic language” forged from the “chilly winter” of her literary landscape. Through her poetic narrative and the poetic language, it engenders, Han engages in an aesthetic exploration of the boundaries between body and soul, and between life and death.
According to Han Kang, the individual and politics, in other words, the individual and history, are inextricably intertwined. This notion begins to emerge in her first full-length novel, The Black Deer (1998), which hasn’t had as much exposure overseas as her other works. The protagonist of this novel is a woman born “in a dark valley,” who desperately struggles to escape from a life of “darkness.” Set in a fictional, abandoned mining village in Gangwon-do, the novel uncovers deeply personal aspects of the characters and explores the innate suffering of human beings. The village is described as “the city that people driven out of rural areas and pushed out of urban slums went to as their last choice.” It is a place where people “die in accidents, and if not in accidents, die of pneumoconiosis,” and are “worked to their bones and, when no longer useful, ruthlessly kicked out.” Once a vital industrial site in the 1970s but reduced to a target of liquidation in the 1980s, the coal mine’s innermost reaches mirror the pitch-black depths of the protagonist’s inner self. Historical records reveal that workers who resisted at the time, along with their families, were tortured, had investigations fabricated against them, and were subsequently imprison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There are many other Korean writers besides Han Kang who also “testify” to the wounds of communities—the scars left on modern Korean history. Han Kang’s Nobel Prize suggests a need for more such Korean works to be recognized, as, unfortunately, “tragedies” and “disasters” have not ceased on this small peninsula, a country that has leaped to an advanced nation from its history of being the last battlefield of the Cold War, the world’s only divided nation, and one of the poorest UN aid recipients. It is only natural that these works are needed because, in the face of these hardships, literature that asks “What makes us human?” has continued as well.
The Bird With No Feet
Novelist Jung Chan’s short story “The Song of Sorrow” may be the most densely constructed narrative of the Auschwitz tragedy written in the Korean language. He weaves together the stories of Asians who repeatedly suffered and inflicted suffering on others in connection with the Nanjing Massacre,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Red Guards, and the Japanese military’s comfort women. The story begins with the suicide of famous Hong Kong actor Leslie Cheung. “A bird without legs” is from a line the actor recites in the film Days of Being Wild, to reflect his life. A bird without legs cannot stay on the ground; it symbolizes a tragic fate filled with emptiness, sorrow, and perpetual drifting. Yet, Jung Chan beautifully portrays these “birds without legs”—those who endure and even embrace such a fateful life.
Father’s Land
“Sapyeong Station,” a story from writer Lim Chulwoo’s short story collection Father’s Land (1984), is set on a winter night at a small station in the countryside of Jeolla Province. The narrative follows a group of common folks waiting for a delayed train: a college student recently expelled for student activism, a woman who moved to Seoul after middle school to work in a bar, and an old, sick farmer. The scars from Gwangju Uprising, the despair of the village, and the tragic lives of the silenced and uneducated unfold like a long-awaited story as the snow falls. Yet, it seems their stories are fated to be buried in the snow before long. At the age of 15, Han Kang read Lim’s work and was struck by how “human life itself becomes the protagonist, instead of a specific character, flowing to the end with an internal rhythm.” Han remarked it was the first work to make her seriously think, “I want to write a novel in my own unique style someday.”
The Country of the Blind
In a survey conducted by Hankyoreh newspaper during the first half of 2024, Korean poets were asked about the “most anti-poetic event of the 21st century.”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response was the “Sewol Ferry Disaster,” suggesting that it is a tragedy so profound it even defies poetry. On April 2014, a passenger ship sank, claiming the lives of more than 300 people. The Country of the Blind is a collection of prose written to commemorate the disaster’s victims and to ensure the tragedy is not forgotten. Novelists Kim Aeran, Kim Yeonsu, Park Mingyu, Hwang Jungeun, and poets Kim Haengsook and Jin Eunyoung contributed to the book. “I don’t know how easy it is—to say there is no hope,” one writer notes. Thus, with restrained language, they write with all their might: “Despair is forbidden.”
We Are Jejudo
Among the materials that Han Kang is said to have referred to while writing the novel We Do Not Part (2021) is Hyun Kiyoung’s full-length work One Spoon on Earth (1999). Hyun is the author of Suni Samchon (1978), the first novel to fully address the tragedy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a topic that was once a forced taboo in Korea. He has since dedicated himself to the literary redemption of Jeju 4.3, and the grand finale of that long journey is his three-volume novel We Are Jejudo, which took four years to complete. In We Are Jejudo, an elderly man named Ahn Changse is approached by his granddaughter and her husband, wanting to make a documentary about the massacre he experienced in his mid-teens. However, Ahn Changse, who “lost his sister and uncle at the same time and was himself dragged to the very threshold of death,” is reluctant to speak; he refuses to remember his past. The question arises: why is he so hesitant? The novel’s plea for speaking and listening is also found at the heart of Han Kang’s We Do Not Part.
Expulsion
During the 1970s and 1980s, South Korea underwent a period of state-led industrialization under military dictatorship. This era was marked by rampant ideological oppressi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labor exploitation. Workers who advocated for their rights were often stigmatized as “commies” who threatened the “anti-communist national policy.” There are works by novelists that deal with the struggles and lives of such workers. However, novels written by female workers themselves are exceedingly rare. One notable work among these novels is by Jang Namsu, who as a teenager worked at Wonpung Mobang, a textile and fabric manufacturing company. In the 1980s, Wonpung Mobang faced the longest labor resistance against the government’s suppression of unions and the most layoffs. Coming from a background of factory work, Jang later studied writing and eventually authored Expulsion. “I felt it was only through a novel that I could tell the stories that were swarming inside me, but at the same time, I didn’t have the courage to do so,” she said about the book, in which her experiences have been shaped into seven short stories. However, this work is not merely a historical record; it marks the beginning of a journey toward reconciliation and healing. One story, for example, features an elderly mother apologizing to her middle-aged daughter for sending her to work in a factory instead of school. When the marginalized assert their existence with all their might, they also pave the way for those who may face marginalization in the future.
Written by Im Intack
Im Intack covers literature at the Hankyoreh. A seasoned journalist, he joined the media company in 2003 and his tenure includes leadership roles in investigative planning and special content. A recipient of the Korea Journalist Award four times and the Kwanhun Club Journalism Award, Im’s contributions extend beyond journalism—he is a co-author of works like A Life Worth 4,000 Won and A Belated Record of Child Abuse. He wrote captions for the photo book MAGNUM KOREA.
Translated by Kim Soyoung
Soyoung is a translator specializing in literature and film. After a decade of corporate life in public relations, she now immerses in translating works that resonate with her.
Her recent translations include stage plays Sunlight Shower and This is Home by Jang Woojae, and she is currently translating a novel for young adults.
Soyoung majored in Engl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studied business administration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She completed a two-year government-funded literary translation course at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LTI Korea).
Soyoung won Grand Prize in the film category of the Media Translation Contest organized by LTI Korea in 2021.
More Content Like This